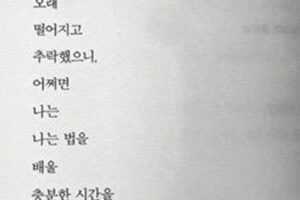한국 나가면 반드시 얼굴을 보지만 전화통화는 거의 안 하는 무당친구와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길래 부조금을 보냈더니 고맙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근황을 물었더니 바쁘다고 했습니다. 몇 년전, 도봉구에서 방학동으로 이사한 후에는 예전 단골들만 드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 지역에서도 이름이 좀 알려져서요. 특히 월 초에는 손님들이 줄을 잇는대요. 어떤 땐 점심도 못 먹고 점사를 볼 정도라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그만큼 심적,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는 반증이니까)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된 일이다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친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언제 죽는지 봐 달라는 여자들이 심심찮게 온다는 말.
“예전에는 중풍이나 기타 다른 병으로 자리보전하고 있는 부모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지. 언제쯤 지긋지긋한 부모 수발에서 헤어날 수 있나 알아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이 언제 죽을 건지 알아 봐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처음이네. 그것도 사지 멀쩡한 남편을…”
놀라서 뭐라고 대꾸를 못하고 잠시 내가 침묵하자 친구가 덧붙입니다.
“부모 죽을 날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는 자체를 죄스러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확연했어요. 나 또한 오죽하면 그럴까, 충실히 점사에 임했고. 그런데 남편 명줄을 알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죄의식이 전혀 안 보여.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졌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자니 자녀 혼사에 지장이 갈 것 같고 주위사람에 대한 이목도 그렇고 재산분활 등도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빨리 남편이 죽는 걸 바란다는 겁니다. 부조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특히 재산요. 예전에는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이 여자에게 불리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반반이래요. 평생 직장일을 안 한 배우자도 재산축적에 기여한 걸로 쳐서 대우를 많이 해 준다네요. 그런데 그 반이 직성에 안 차는 겁니다. 온전히 혼자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을 날을 기다릴 밖에. 우와, 참 경악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돈, 돈, 돈.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진즉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하루빨리 죽여서까지 돈을 차지하고 싶어 하다니요.
아닌게아니라 가끔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긴 합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승에서 부부로 다시 만난다더니 그말을 실감하면서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죽기를 바란 적은 없지요.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에 웬만하면 참고 잘 해줘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란 사람이니까요.
지병으로 몇 년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던 남편을 떠나보낸 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둘의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만 남편이 화장실만 혼자 몸으로 근근히 가는 상태가 지속되자 둘의 사이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각자 개인을 놓고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둘이 지독하게 안 맞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혼하는 게 둘의 인생을 위해서도 옳을 것 같을 정도로요. 아닌게아니라 남편은 이혼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내가 부인보다 남편과 더 친해서)살았습니다. 부인을 만난 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그러나 둘은 자식때문인지 이혼할 팔자가 안 되었는지 지옥의 아귀들처럼 싸우면서도 40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아프게 되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후련해 할 줄 알았어요. 바퀴벌레처럼 꼴보기 싫어하던 존재가 눈 앞에 안 보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예외입니다. 지금까지도 부인이 매일 눈물바람입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그리워서 가슴이 에어진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도 좋으니 지금 옆에만 있어준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해요.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결혼하겠답니다. 이승에서 못해 준 것, 내승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해주겠답니다.
지난 달, 62년의 결혼생활을 한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이 스물 세살 때, 남편이 스물 다섯살 때 결혼해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더구나 자영업을 하느라 한시도 떨어져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자타가 인정하는 금슬이었습니다. 62년동안 눈 뜨면 바로 앞에 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렸을 때의 허망함과 아픔과 상실감이 어떨지 감이 잡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육신의 한 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그녀를 보면서 부부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사이가 좋으면 혼자 남겨졌을 때의 슬픔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나도 슬슬 황혼길에 들어 선 나이. 나와 둘 중에 언제 누가 먼저 떠날지 장담을 못합니다. 하도 변수가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니까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져버렸을 경우를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나오고 가슴이 미어지고 목이 메입니다.
근황을 물었더니 바쁘다고 했습니다. 몇 년전, 도봉구에서 방학동으로 이사한 후에는 예전 단골들만 드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 지역에서도 이름이 좀 알려져서요. 특히 월 초에는 손님들이 줄을 잇는대요. 어떤 땐 점심도 못 먹고 점사를 볼 정도라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그만큼 심적,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는 반증이니까)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된 일이다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친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언제 죽는지 봐 달라는 여자들이 심심찮게 온다는 말.
“예전에는 중풍이나 기타 다른 병으로 자리보전하고 있는 부모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지. 언제쯤 지긋지긋한 부모 수발에서 헤어날 수 있나 알아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이 언제 죽을 건지 알아 봐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처음이네. 그것도 사지 멀쩡한 남편을…”
놀라서 뭐라고 대꾸를 못하고 잠시 내가 침묵하자 친구가 덧붙입니다.
“부모 죽을 날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는 자체를 죄스러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확연했어요. 나 또한 오죽하면 그럴까, 충실히 점사에 임했고. 그런데 남편 명줄을 알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죄의식이 전혀 안 보여.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졌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자니 자녀 혼사에 지장이 갈 것 같고 주위사람에 대한 이목도 그렇고 재산분활 등도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빨리 남편이 죽는 걸 바란다는 겁니다. 부조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특히 재산요. 예전에는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이 여자에게 불리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반반이래요. 평생 직장일을 안 한 배우자도 재산축적에 기여한 걸로 쳐서 대우를 많이 해 준다네요. 그런데 그 반이 직성에 안 차는 겁니다. 온전히 혼자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을 날을 기다릴 밖에. 우와, 참 경악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돈, 돈, 돈.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진즉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하루빨리 죽여서까지 돈을 차지하고 싶어 하다니요.
아닌게아니라 가끔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긴 합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승에서 부부로 다시 만난다더니 그말을 실감하면서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죽기를 바란 적은 없지요.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에 웬만하면 참고 잘 해줘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란 사람이니까요.
지병으로 몇 년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던 남편을 떠나보낸 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둘의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만 남편이 화장실만 혼자 몸으로 근근히 가는 상태가 지속되자 둘의 사이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각자 개인을 놓고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둘이 지독하게 안 맞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혼하는 게 둘의 인생을 위해서도 옳을 것 같을 정도로요. 아닌게아니라 남편은 이혼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내가 부인보다 남편과 더 친해서)살았습니다. 부인을 만난 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그러나 둘은 자식때문인지 이혼할 팔자가 안 되었는지 지옥의 아귀들처럼 싸우면서도 40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아프게 되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후련해 할 줄 알았어요. 바퀴벌레처럼 꼴보기 싫어하던 존재가 눈 앞에 안 보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예외입니다. 지금까지도 부인이 매일 눈물바람입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그리워서 가슴이 에어진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도 좋으니 지금 옆에만 있어준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해요.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결혼하겠답니다. 이승에서 못해 준 것, 내승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해주겠답니다.
지난 달, 62년의 결혼생활을 한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이 스물 세살 때, 남편이 스물 다섯살 때 결혼해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더구나 자영업을 하느라 한시도 떨어져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자타가 인정하는 금슬이었습니다. 62년동안 눈 뜨면 바로 앞에 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렸을 때의 허망함과 아픔과 상실감이 어떨지 감이 잡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육신의 한 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그녀를 보면서 부부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사이가 좋으면 혼자 남겨졌을 때의 슬픔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나도 슬슬 황혼길에 들어 선 나이. 나와 둘 중에 언제 누가 먼저 떠날지 장담을 못합니다. 하도 변수가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니까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져버렸을 경우를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나오고 가슴이 미어지고 목이 메입니다.
이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