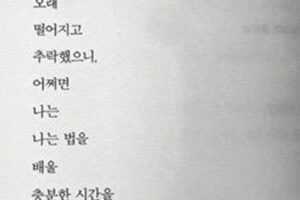남편의 작은아버지 부부가 왔습니다. 이사온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집에 온 첫 친척입니다. 그동안 집을 세 번 이사하면서 살았으나 남편의 친척 그 누구도 우리집에 와 본 적 없습니다. 오, 시부모가 이 집 산 직후 딱 한 번 왔었더랬네요. 그것도 일부러 온 건 아니고 네바다 주의 ‘리노’란 곳으로 여행가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차 고칠 동안 하룻밤 자고 갔어요. 그게 다지요. 대신 우리가 시집에 자주 갔었지요. 음, 그러고보니 뭐 그리 자주는 아니었네요. 1년에 서너번.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두 양반 생일 때.
작은아버지는 차로 세 시간 걸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재작년부터 두어달에 한 번씩, 왕복 여섯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작은 아버지를 보러갔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니 재작년,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부쩍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요. 남아있는 남자어른은 작은아버지 한 명뿐이어서 뒤늦게 소중함과 친밀감을 느낀 것일까요.
작은아버지 부부는 자식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으나 하나는 오래전에 심장마비로 죽었고 하나 남은 아들은 다른 주에 삽니다. 거의 왕래가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국생활에서 시간 들이고 돈 들여 부모를 보러 오는 일은 보통 큰맘을 먹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명절 때도 기념일 때도 서로 얼굴 보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에게도 남편이 유일한 남자 조카입니다. 한 명 있는 고모에게는 딸만 둘 있어요. 참 단촐한 집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어쩌다가 가보면 다 모였다는 식구가 열명 남짓입니다.
작년 겨울, 고모 큰 딸의 아들, 그러니까 고종사촌의 아들이 결혼한다길래 거의 십년만에 작은아버지집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작은아버지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팔순을 기념한 생일파티가 몇 년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있었으나 나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요. 섭섭해하지도, 괘씸해하지도 않으니까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남처럼 지내다가도 만나면 미칠 정도로 반가워합니다. 껴안고 볼에 입 맞추고 같이 사진 찍자고 난리고.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친구들한테 하면 부러워 죽습니다. 사돈의 팔촌 경조사까지 챙겨가며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겹다네요.
사촌 아들 결혼식에서 작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주 좀 보자꾸나. 아닌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여든 여덟입니다. 건강도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에, 그렇게 하십시다하고 넙죽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잘했으나 내가 워낙 어디 가는 걸 싫어하기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갈 때 같이 따라나서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시집에는 예의와 도리때문이라도 억지로 갔었지만 작은아버지는 한 다리 건너입니다. 그런 도리와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한시하게 됩디다.
이번에 작은아버지가 올라온 것은 단지 우리 얼굴 보러.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 놓고 사는지 보고 싶다고요. 몇 달만에 보는 작은아버지 얼굴은 더 늙었고 어깨는 더 구부정했고 다리 힘은 더욱 빠진 것 같았습니다. 몇 발자욱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손은 떨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얼마 못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늘어 놓느라. 이 집을 어떻게해서 샀는지. 은퇴생활은 어떤지. 최근에 금 덩어리를 어떻게 캤는지에 대한 얘기. 작은아버지 얼굴에 나타난 피곤을 보았을 텐데 놔 줄 줄을 모릅니다. 작은아버지 역시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먼저 자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형연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안쓰러워서요. 위에도 말했지만 남편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남자 어른이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마저 떠나고나면 남편은 완전히 외돌톨이가 됩니다. 갈 데도 없게 되고 전화할 데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 번 글에 쓴대로 남편은 나를 잘 만났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 한 일이 나랑 결혼한 일이라고 남한테도, 나한테도 늘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서 ‘가족’이란 울타리가, 피붙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남편이 나를 만난 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없는 외동인 남편.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가족이긴 하지만 나 또한 혼자입니다. 동생 둘이 있으나 한국에 삽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혼자라는 게 남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 역시 그렇겠지만 남편의 노년은 정말로 쓸쓸하고 외로울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입양이라도 할 걸,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팔자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애써 팔자를 거스르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지요. 의붓자식이나 입양자녀들의 만행과 범죄들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팔자에 없는 자식을 억지로 만들어 들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글 때문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번도 입양을 고려해 본 적 없어요. 강아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고 편안했으니까.
어릴 때 나는 동생들이 밉고 지겨웠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방을 나누어야했기 때문입니다. 한 쪽 구석에 쌓아놓은 곡식 가마니에서 기어나온 바구미가 드글드글한 방을 네 명이 써야했어요. 그마저도 여름 뿐이었어요. 동절기엔 연료를 아끼기 위해 방 하나에 부모랑 모두 오글오글 모여서 지냈습니다. 그때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난방이 안 되어도 좋고 해가 안 들어도 좋으니 작은 창문이 있는 방 하나를 혼자 쓰는 것.
세월이 가고 우리 부모는 앞 다투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 있던 동생도 그 중 하나가 부모 뒤를 쫒아 가면서 둘로 줄었고 그 동생들마저 자식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사나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 예닐곱의 단촐한 식구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도 머릿수를 채워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나는 미국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동생들한테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특히 남편에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난 남편에게. 형제 자매가 많은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은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차로 세 시간 걸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재작년부터 두어달에 한 번씩, 왕복 여섯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작은 아버지를 보러갔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니 재작년,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부쩍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요. 남아있는 남자어른은 작은아버지 한 명뿐이어서 뒤늦게 소중함과 친밀감을 느낀 것일까요.
작은아버지 부부는 자식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으나 하나는 오래전에 심장마비로 죽었고 하나 남은 아들은 다른 주에 삽니다. 거의 왕래가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국생활에서 시간 들이고 돈 들여 부모를 보러 오는 일은 보통 큰맘을 먹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명절 때도 기념일 때도 서로 얼굴 보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에게도 남편이 유일한 남자 조카입니다. 한 명 있는 고모에게는 딸만 둘 있어요. 참 단촐한 집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어쩌다가 가보면 다 모였다는 식구가 열명 남짓입니다.
작년 겨울, 고모 큰 딸의 아들, 그러니까 고종사촌의 아들이 결혼한다길래 거의 십년만에 작은아버지집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작은아버지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팔순을 기념한 생일파티가 몇 년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있었으나 나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요. 섭섭해하지도, 괘씸해하지도 않으니까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남처럼 지내다가도 만나면 미칠 정도로 반가워합니다. 껴안고 볼에 입 맞추고 같이 사진 찍자고 난리고.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친구들한테 하면 부러워 죽습니다. 사돈의 팔촌 경조사까지 챙겨가며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겹다네요.
사촌 아들 결혼식에서 작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주 좀 보자꾸나. 아닌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여든 여덟입니다. 건강도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에, 그렇게 하십시다하고 넙죽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잘했으나 내가 워낙 어디 가는 걸 싫어하기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갈 때 같이 따라나서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시집에는 예의와 도리때문이라도 억지로 갔었지만 작은아버지는 한 다리 건너입니다. 그런 도리와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한시하게 됩디다.
이번에 작은아버지가 올라온 것은 단지 우리 얼굴 보러.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 놓고 사는지 보고 싶다고요. 몇 달만에 보는 작은아버지 얼굴은 더 늙었고 어깨는 더 구부정했고 다리 힘은 더욱 빠진 것 같았습니다. 몇 발자욱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손은 떨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얼마 못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늘어 놓느라. 이 집을 어떻게해서 샀는지. 은퇴생활은 어떤지. 최근에 금 덩어리를 어떻게 캤는지에 대한 얘기. 작은아버지 얼굴에 나타난 피곤을 보았을 텐데 놔 줄 줄을 모릅니다. 작은아버지 역시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먼저 자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형연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안쓰러워서요. 위에도 말했지만 남편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남자 어른이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마저 떠나고나면 남편은 완전히 외돌톨이가 됩니다. 갈 데도 없게 되고 전화할 데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 번 글에 쓴대로 남편은 나를 잘 만났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 한 일이 나랑 결혼한 일이라고 남한테도, 나한테도 늘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서 ‘가족’이란 울타리가, 피붙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남편이 나를 만난 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없는 외동인 남편.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가족이긴 하지만 나 또한 혼자입니다. 동생 둘이 있으나 한국에 삽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혼자라는 게 남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 역시 그렇겠지만 남편의 노년은 정말로 쓸쓸하고 외로울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입양이라도 할 걸,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팔자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애써 팔자를 거스르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지요. 의붓자식이나 입양자녀들의 만행과 범죄들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팔자에 없는 자식을 억지로 만들어 들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 있습니다. 그런 글 때문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번도 입양을 고려해 본 적 없어요. 강아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고 편안했으니까.
어릴 때 나는 동생들이 밉고 지겨웠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방을 나누어야했기 때문입니다. 한 쪽 구석에 쌓아놓은 곡식 가마니에서 기어나온 바구미가 드글드글한 방을 네 명이 써야했어요. 그마저도 여름 뿐이었어요. 동절기엔 연료를 아끼기 위해 방 하나에 부모랑 모두 오글오글 모여서 지냈습니다. 그때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난방이 안 되어도 좋고 해가 안 들어도 좋으니 작은 창문이 있는 방 하나를 혼자 쓰는 것.
세월이 가고 우리 부모는 앞 다투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 있던 동생도 그 중 하나가 부모 뒤를 쫒아 가면서 둘로 줄었고 그 동생들마저 자식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사나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 예닐곱의 단촐한 식구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도 머릿수를 채워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나는 미국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동생들한테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특히 남편에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난 남편에게. 형제 자매가 많은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은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