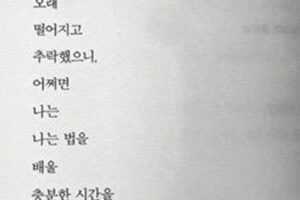고향 친구 중 현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으나 남자처럼 어감이 강하고 뜻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바꾸었답니다. 이름을 바꾸었어도 크게 소용이 없나 봅니다. 예순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현아가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 해 12월. 현아가 위중하다는 건 가족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가 있었지요. 나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한국의 몇몇 친구들과 가끔 문자를 주고 받았었지만 현아 상태에 대해 일체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고.
지난 번, 한국방문을 준비하면서 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몇월 며칠 고향에 도착할 거니까 얼굴 보자고. 속으로는 과연 현아가 나를 만나러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요. 항암치료 중인데 많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예상외로 현아는 담담했습니다. 어려운 걸음했으니까 꼭 만나자고. 보고 싶다고. 나는 현아를 위해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커버된다고 하나 직장일을 못하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아는 내가 고향에 도착한지 이틀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일찍 현아 이름이 찍힌 부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나 나나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살겠다 싶으니 명이 다 한 것입니다.
곧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아 부고에 경악과 충격을 받은 친구들로부터지요. 위에도 말했지만 현아가 시한부선고를 받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현아의 죽음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중에는 영선이의 충격은 다른 친구보다 더 강했어요. 현아랑 많이 친했던 영선이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현아의 병과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자책으로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나는 영선이를 달랬습니다. 친구들 아무도 몰랐다고. 현아가 자기의 몸 상태에 대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있어 소문이 퍼지지 않는다는 특성상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현아의 장례식장. 친구가 모두 할배들 뿐인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조사(弔詞)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친구의 장례식은 처음입니다. 나는 차마 현아의 영정사진을 바로 볼 수 없어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급히 내려온 영선이랑 몸을 기대고 한구석에 하염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30분도 있지 못하고 바로 나와야했습니다. 지난번 글에 쓴 친구 태숙이가 남편과 같이 대구에서 내려와 있었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동생가족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친구 종국이로부터 현아가 수목장으로 이 세상과 영원히 하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아의 작은 육신은 한 나무의 자양분이 되어 푸르게 다시 피어나리라,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출국 사흘 전, 서울로 올라가서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영선이한테서 문자가 날아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현아의 죽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사진도 한 장 보냈더군요. 몇 년전 사진이었습니다. 뜻밖의 사진을 받고 나는 잠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가져도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는 되지도 않은 쇠고집을 피우다 마침내 장만하게 된 스마트폰으로 고향친구들과 다 연락이 닿았을 때, 어릴 때 헤어진 친구들과 몇 십년 만에 다시 만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국 방문 때마다 내가 묵는 호텔로 쑥떡을 배달해 주는 친구 미연이도 있었고 내 몸 따뜻해지라고 홍삼 엑기스를 늘 선물해 주는 영선이도 있었고 현아도 있었습니다. 현아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손톱 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전, 우리들 넷의 즐거운 시간이 거기에 박제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두번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현아의 모습. 참으로 허탈하고 허망하고 서글펐어요. 하루하루 죽음으로, 소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은 우리 셋 중 누가 먼저 죽음의 강에 발을 담글까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미연이가 될 수도 있고 영선이가 될 수도 있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나 둘씩 떠나겠지요. 그렇잖아도 부산에 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있던 나는 사진을 들여다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친구 장례식에서 돌아오면 세상을 다 잃은 듯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 무당친구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딴때 같으면 무당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냥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어서요. 무당친구도 혼자 떠들다가 내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입을 다뭅니다. 좀 미안한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위에 설명했던 사진. 사진 속의 네 명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참고로 무당친구는 동향이긴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살았기에 사진 속의 친구들을 모릅니다. 몇 년 전 호텔에서 만났던 미연이 외에는.
무당친구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 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무당친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친구가 영험한 무당이라면, 신통력이 있는 무당이라면 사진 속의 한 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않겠어요? 예전에 죽은 사람의 사주를 들고 서울 시내에 포진해 있는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신통력 유무를 가려내는 텔레비젼 방송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주와 똑같은 한 노숙자의 사주를 들고 무당들을 시험해봤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를 보자 그 생각이 전구에 불 들어오듯 반짝,하고 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알아 맞추었냐고요? 아니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한테는 엄청 화려하네라고 말하고 현아를 가리키면서는 또래보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선이 한테는 네 명중 제일 어려 보이네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나라면 분명히 한 마디 했을 겁니다. 야야, 이 엉터리야. 네가 무슨 무당이냐. 죽은 사람, 산 사람도 알아내지 못하면서라고 핀잔을 주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무당친구가 알아맞췄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인지 나는 조로[早老]한 편입니다. 높은 학식도, 빛나던 외모도, 태산같은 부(富)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즉 깨달았습니다. 이번 현아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니(그렇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요즘같이 변수가 많은 때에 내가 무사하게 살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그냥 보람된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비드가 살짝 완화되는 것 같더니 ‘원숭이두창’이란 이름도 생소한 전염병이 또 창궐하는 걸 보세요. 우리에게 준비된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현아가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은 건 지난 해 12월. 현아가 위중하다는 건 가족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가 있었지요. 나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한국의 몇몇 친구들과 가끔 문자를 주고 받았었지만 현아 상태에 대해 일체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고.
지난 번, 한국방문을 준비하면서 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몇월 며칠 고향에 도착할 거니까 얼굴 보자고. 속으로는 과연 현아가 나를 만나러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요. 항암치료 중인데 많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예상외로 현아는 담담했습니다. 어려운 걸음했으니까 꼭 만나자고. 보고 싶다고. 나는 현아를 위해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커버된다고 하나 직장일을 못하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아는 내가 고향에 도착한지 이틀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일찍 현아 이름이 찍힌 부고를 받고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나 나나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살겠다 싶으니 명이 다 한 것입니다.
곧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아 부고에 경악과 충격을 받은 친구들로부터지요. 위에도 말했지만 현아가 시한부선고를 받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현아의 죽음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중에는 영선이의 충격은 다른 친구보다 더 강했어요. 현아랑 많이 친했던 영선이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현아의 병과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자책으로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나는 영선이를 달랬습니다. 친구들 아무도 몰랐다고. 현아가 자기의 몸 상태에 대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있어 소문이 퍼지지 않는다는 특성상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현아의 장례식장. 친구가 모두 할배들 뿐인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조사(弔詞)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친구의 장례식은 처음입니다. 나는 차마 현아의 영정사진을 바로 볼 수 없어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급히 내려온 영선이랑 몸을 기대고 한구석에 하염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30분도 있지 못하고 바로 나와야했습니다. 지난번 글에 쓴 친구 태숙이가 남편과 같이 대구에서 내려와 있었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동생가족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친구 종국이로부터 현아가 수목장으로 이 세상과 영원히 하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아의 작은 육신은 한 나무의 자양분이 되어 푸르게 다시 피어나리라, 아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출국 사흘 전, 서울로 올라가서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영선이한테서 문자가 날아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현아의 죽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사진도 한 장 보냈더군요. 몇 년전 사진이었습니다. 뜻밖의 사진을 받고 나는 잠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가져도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는 되지도 않은 쇠고집을 피우다 마침내 장만하게 된 스마트폰으로 고향친구들과 다 연락이 닿았을 때, 어릴 때 헤어진 친구들과 몇 십년 만에 다시 만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국 방문 때마다 내가 묵는 호텔로 쑥떡을 배달해 주는 친구 미연이도 있었고 내 몸 따뜻해지라고 홍삼 엑기스를 늘 선물해 주는 영선이도 있었고 현아도 있었습니다. 현아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손톱 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전, 우리들 넷의 즐거운 시간이 거기에 박제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두번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현아의 모습. 참으로 허탈하고 허망하고 서글펐어요. 하루하루 죽음으로, 소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은 우리 셋 중 누가 먼저 죽음의 강에 발을 담글까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미연이가 될 수도 있고 영선이가 될 수도 있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나 둘씩 떠나겠지요. 그렇잖아도 부산에 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있던 나는 사진을 들여다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친구 장례식에서 돌아오면 세상을 다 잃은 듯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 무당친구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딴때 같으면 무당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냥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어서요. 무당친구도 혼자 떠들다가 내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입을 다뭅니다. 좀 미안한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위에 설명했던 사진. 사진 속의 네 명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참고로 무당친구는 동향이긴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살았기에 사진 속의 친구들을 모릅니다. 몇 년 전 호텔에서 만났던 미연이 외에는.
무당친구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 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무당친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친구가 영험한 무당이라면, 신통력이 있는 무당이라면 사진 속의 한 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않겠어요? 예전에 죽은 사람의 사주를 들고 서울 시내에 포진해 있는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신통력 유무를 가려내는 텔레비젼 방송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주와 똑같은 한 노숙자의 사주를 들고 무당들을 시험해봤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를 보자 그 생각이 전구에 불 들어오듯 반짝,하고 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알아 맞추었냐고요? 아니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한테는 엄청 화려하네라고 말하고 현아를 가리키면서는 또래보다 나이가 좀 들어보이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선이 한테는 네 명중 제일 어려 보이네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나라면 분명히 한 마디 했을 겁니다. 야야, 이 엉터리야. 네가 무슨 무당이냐. 죽은 사람, 산 사람도 알아내지 못하면서라고 핀잔을 주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무당친구가 알아맞췄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서 인지 나는 조로[早老]한 편입니다. 높은 학식도, 빛나던 외모도, 태산같은 부(富)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즉 깨달았습니다. 이번 현아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니(그렇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요즘같이 변수가 많은 때에 내가 무사하게 살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그냥 보람된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비드가 살짝 완화되는 것 같더니 ‘원숭이두창’이란 이름도 생소한 전염병이 또 창궐하는 걸 보세요. 우리에게 준비된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계숙 작가